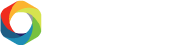- 맛있는 전주
디자인구성요소
전주의 시절음식 설날(세찬상)세찬(歲饌)은 설날 차례상에 올리는 여러 가지 음식이다. 세배 손님을 대접하는 음식을 가리키기도 한다. 세주(歲酒)는 세찬과 함께 마시는 술이다. 세찬의 가짓수와 양은 집안 형편에 따라 달라진다. 전주 세찬상에는 흰떡과 떡국, 강정과 콩나물잡채를 반드시 차려낸다.
설날(세찬상)세찬(歲饌)은 설날 차례상에 올리는 여러 가지 음식이다. 세배 손님을 대접하는 음식을 가리키기도 한다. 세주(歲酒)는 세찬과 함께 마시는 술이다. 세찬의 가짓수와 양은 집안 형편에 따라 달라진다. 전주 세찬상에는 흰떡과 떡국, 강정과 콩나물잡채를 반드시 차려낸다. 정월보름상복쌈(福裹), 부럼깨기(嚼癤), 귀밝이술(耳明酒), 아홉 가지의 묵은 나물(上元菜) 등을 먹었다. 복쌈은 오곡밥, 취나물, 배춧잎을 김에 싸서 만든다. ‘노적밥’도 복쌈의 한 종류다. 귀밝이술은 차게 해서 마신다. 귀밝이술을 마시면 귀가 밝아지고 좋은 소식을 듣게 된다고 믿었다.
정월보름상복쌈(福裹), 부럼깨기(嚼癤), 귀밝이술(耳明酒), 아홉 가지의 묵은 나물(上元菜) 등을 먹었다. 복쌈은 오곡밥, 취나물, 배춧잎을 김에 싸서 만든다. ‘노적밥’도 복쌈의 한 종류다. 귀밝이술은 차게 해서 마신다. 귀밝이술을 마시면 귀가 밝아지고 좋은 소식을 듣게 된다고 믿었다. 2월 음식음력 2월 초하루를 ‘허드렛날(머슴날, 奴婢日)’이라고 부른다. 가을걷이를 마친 뒤 겨우내 쉰 머슴들은 이 무렵부터 농사일을 준비했다. 주인은 콩으로 소를 넣은 송편을 크게 빚어 노비들에게 나이 수만큼 나누어 주었다. 큰 가마솥에 콩을 볶아서 먹기도 했다.
2월 음식음력 2월 초하루를 ‘허드렛날(머슴날, 奴婢日)’이라고 부른다. 가을걷이를 마친 뒤 겨우내 쉰 머슴들은 이 무렵부터 농사일을 준비했다. 주인은 콩으로 소를 넣은 송편을 크게 빚어 노비들에게 나이 수만큼 나누어 주었다. 큰 가마솥에 콩을 볶아서 먹기도 했다. 3월 음식음력 3월 초사흘 삼짇날(三辰日)에는 들에 나가 꽃놀이를 하고 새 풀을 밟으며 봄을 즐겼다. 이 날을 ‘답청절(踏靑節)’이라고 부르는 까닭이다. 전주에서는 오목대에 부녀자들이 모여서 찹쌀가루를 반죽하여 화전(花煎)을 부쳐먹는 화전놀이를 즐겼다고 한다.
3월 음식음력 3월 초사흘 삼짇날(三辰日)에는 들에 나가 꽃놀이를 하고 새 풀을 밟으며 봄을 즐겼다. 이 날을 ‘답청절(踏靑節)’이라고 부르는 까닭이다. 전주에서는 오목대에 부녀자들이 모여서 찹쌀가루를 반죽하여 화전(花煎)을 부쳐먹는 화전놀이를 즐겼다고 한다. 3월 고사음식삼짇날에 지내는 ‘삼짇고사’에서는 떡과 북어포, 정화수 등 간단한 제물을 마련하여 조상님과 성주신에게 가족의 무병장수와 집안의 번창을 빌었다. 또 문중의 시제를 지내기도 하였고, 마을의 안녕과 한 해의 풍년농사를 기원하는 마을 단위의 제사도 지냈다.
3월 고사음식삼짇날에 지내는 ‘삼짇고사’에서는 떡과 북어포, 정화수 등 간단한 제물을 마련하여 조상님과 성주신에게 가족의 무병장수와 집안의 번창을 빌었다. 또 문중의 시제를 지내기도 하였고, 마을의 안녕과 한 해의 풍년농사를 기원하는 마을 단위의 제사도 지냈다. 4월 음식보리가 익어갈 무렵이다. 1년 중 먹을 것이 가장 부족해서 보리수확만 애타게 기다린다 해서 생긴 ‘보릿고개’도 이 무렵이다. 4월 시절음식으로는 느티떡, 미나리강회, 어채, 시루떡 등이 있다. 전주에서는 연한 마늘대로 적을 부치고, 미나리나물과 두릅나물을 먹었다.
4월 음식보리가 익어갈 무렵이다. 1년 중 먹을 것이 가장 부족해서 보리수확만 애타게 기다린다 해서 생긴 ‘보릿고개’도 이 무렵이다. 4월 시절음식으로는 느티떡, 미나리강회, 어채, 시루떡 등이 있다. 전주에서는 연한 마늘대로 적을 부치고, 미나리나물과 두릅나물을 먹었다. 5월 음식음력 5월 5일 단오(端午)는 한해 중 가장 양기가 왕성한 날이다. 단오 절식으로는 수리취떡, 앵두화채, 앵두편, 붕어찜 등이 있다. 수리취떡은 삶은 수리취를 멥쌀과 함께 쳐서 수레바퀴 문양 떡살을 박아 만든 절편이다. 익모초와 쑥을 뜯는 풍습이 있어 쑥떡도 만들어 먹었다.
5월 음식음력 5월 5일 단오(端午)는 한해 중 가장 양기가 왕성한 날이다. 단오 절식으로는 수리취떡, 앵두화채, 앵두편, 붕어찜 등이 있다. 수리취떡은 삶은 수리취를 멥쌀과 함께 쳐서 수레바퀴 문양 떡살을 박아 만든 절편이다. 익모초와 쑥을 뜯는 풍습이 있어 쑥떡도 만들어 먹었다. 6월 음식음력 6월 보름을 유두일(流頭日)이라고 부른다. 이날에는 햇밀가루로 국수와 떡을 마련하고, 새로 익은 참외와 수박으로 조상님께 유두차례(流頭茶禮)를 지냈다. 유두국수를 먹으면 누구나 오래 살 수 있고, 무더위에도 지치지 않는다고 믿었다.
6월 음식음력 6월 보름을 유두일(流頭日)이라고 부른다. 이날에는 햇밀가루로 국수와 떡을 마련하고, 새로 익은 참외와 수박으로 조상님께 유두차례(流頭茶禮)를 지냈다. 유두국수를 먹으면 누구나 오래 살 수 있고, 무더위에도 지치지 않는다고 믿었다. 7월 음식음력 7월 보름, 백중일(百中日)이다. 햇곡식, 햇과일, 채소가 백 가지나 나온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날은 농사를 쉬고 술과 음식을 장만해서 나누어 먹으며 하루를 보냈다. 전주 사람들은 복숭아와 밀국수, 민어탕, 팥칼국수, 오모가리탕 등을 즐겼다.
7월 음식음력 7월 보름, 백중일(百中日)이다. 햇곡식, 햇과일, 채소가 백 가지나 나온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날은 농사를 쉬고 술과 음식을 장만해서 나누어 먹으며 하루를 보냈다. 전주 사람들은 복숭아와 밀국수, 민어탕, 팥칼국수, 오모가리탕 등을 즐겼다. 7월 고사음식조상의 혼을 천도하는 제사를 지내는 날이라고 해서 음력 7월 보름을 망혼일(亡魂日)이라고 하였다. 불가(佛家)에서는 오미백과(五味白果)를 갖추어 공양했다고 한다. ‘망혼일’이라 한 것은 이날 밤에 채소, 과일, 술, 밥 등을 차려놓고 돌아가신 어버이의 혼을 부른 데서 유래했다.
7월 고사음식조상의 혼을 천도하는 제사를 지내는 날이라고 해서 음력 7월 보름을 망혼일(亡魂日)이라고 하였다. 불가(佛家)에서는 오미백과(五味白果)를 갖추어 공양했다고 한다. ‘망혼일’이라 한 것은 이날 밤에 채소, 과일, 술, 밥 등을 차려놓고 돌아가신 어버이의 혼을 부른 데서 유래했다. 8월 음식8월에는 오곡백과가 풍성한 고유의 명절 추석이 들어 있다. 추석 전날에는 각종 전과 송편, 나물 등을 만들었다. 추석날이 되면 새 옷으로 갈아입었다. 햇곡식으로 밥을 짓고, 과일을 올려 차례를 지냈다. 차례상을 물린 뒤에는 성묘를 가서 가족끼리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
8월 음식8월에는 오곡백과가 풍성한 고유의 명절 추석이 들어 있다. 추석 전날에는 각종 전과 송편, 나물 등을 만들었다. 추석날이 되면 새 옷으로 갈아입었다. 햇곡식으로 밥을 짓고, 과일을 올려 차례를 지냈다. 차례상을 물린 뒤에는 성묘를 가서 가족끼리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 9월 음식음력 9월 9일은 중양절(重陽節)이다. 사람들은 산과 계곡을 찾아서 오색 단풍을 즐겼다. 시(詩)를 지어 부르며 놀았다. 각 가정에서는 국화꽃을 찹쌀가루와 반죽하여 국화전을 부쳐 먹고, 술에 국화를 넣어서 향기를 낸 국화주를 빚어 마셨다.
9월 음식음력 9월 9일은 중양절(重陽節)이다. 사람들은 산과 계곡을 찾아서 오색 단풍을 즐겼다. 시(詩)를 지어 부르며 놀았다. 각 가정에서는 국화꽃을 찹쌀가루와 반죽하여 국화전을 부쳐 먹고, 술에 국화를 넣어서 향기를 낸 국화주를 빚어 마셨다. 10월 음식음력 10월 15일을 전후하여 시제를 지내는 풍습이 있었다. 10월의 오일(午日)을 특별히 ‘말날’이라고 부른다. 말을 기르는 사람들은 팥으로 시루떡을 만들어 마굿간에 차려 놓고 고사를 지내며 말의 무탈을 빌었다. 햇무로 떡을 쪄서 먹기도 했다.
10월 음식음력 10월 15일을 전후하여 시제를 지내는 풍습이 있었다. 10월의 오일(午日)을 특별히 ‘말날’이라고 부른다. 말을 기르는 사람들은 팥으로 시루떡을 만들어 마굿간에 차려 놓고 고사를 지내며 말의 무탈을 빌었다. 햇무로 떡을 쪄서 먹기도 했다. 11월 음식동지가 든 달이다. 동짓날에는 어느 집에서나 팥죽을 쑤어 먹었다. 동지팥죽에는 나이 수만큼 찹쌀로 만든 새알심을 넣어 먹었다. 동짓달 초순에 든 동지를 ‘애동지(兒冬至)’라고 불렀는데,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팥죽 대신 팥떡을 해먹었다.
11월 음식동지가 든 달이다. 동짓날에는 어느 집에서나 팥죽을 쑤어 먹었다. 동지팥죽에는 나이 수만큼 찹쌀로 만든 새알심을 넣어 먹었다. 동짓달 초순에 든 동지를 ‘애동지(兒冬至)’라고 불렀는데,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팥죽 대신 팥떡을 해먹었다. 12월 음식음력 12월 30일을 섣달그믐, 제야(除夜), 제석(除夕)이라 한다. 어른들께 묵은세배를 올리고, 손님맞이 세찬을 준비했다. 섣달그믐 밤에 자는 아이가 있으면 쌀가루를 개어 자는 아이의 눈썹에 바르고 깨워 거울을 보게 하면서 놀리는 풍습이 있었다.
12월 음식음력 12월 30일을 섣달그믐, 제야(除夜), 제석(除夕)이라 한다. 어른들께 묵은세배를 올리고, 손님맞이 세찬을 준비했다. 섣달그믐 밤에 자는 아이가 있으면 쌀가루를 개어 자는 아이의 눈썹에 바르고 깨워 거울을 보게 하면서 놀리는 풍습이 있었다.